
9월의 마지막날인 휴일...
모처럼 서울 나들이 다녀왔어요.
문화생활이라고는 서점 둘러보기(?)와 영화 관람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저와 친구는 불혹이라는 나이를 잊고 여고시절 문학소녀로 돌아간 하루였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이름 하여,
‘서울 문학 투어’ <외등>의 작가인 박범신 선생님을 모시고
작품 속 장소를 찾아 떠나는 짧은 여행 겸 만남이에요.
아무튼 늦게 도착한 친구와 헐레벌떡 버스에 올라
외등의 주요 무대인 장충동 언덕길과 가회동 한옥을 둘러보았어요.
저와 친구는 박범신 선생님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며
설명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 북 카페로 이동해 차 한 잔씩 마시며
문학평론가인 이선우 씨 진행으로 작가와의 시간을 가졌죠.
3시 30분 쯤 시작해 2시간 내내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과
이선우 씨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귀가 내내 즐거웠어요.
소설쓰기가 天刑이라는 것과,
가슴 속에 커다란 낙지 한 마리 산다는 것과,
(쓰지 않으면 이 낙지 녀석이 생살을 찢고 나온대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절필선언 이유와 그 외 작품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런데 35년 동안 발표한 책이 60권이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솔직히 7,8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제대로 읽은 게 <흰 소가 끄는 수레>였고 최근엔 <나마스떼>와 따님이 삽화를 하고 선생님이 쓰신 산문을 곁들인 책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시집까지 내셨더라고요.(새로운 사실!)
얼마 전까지 명지대에서 문창과 학생들 지도했는데
퇴직하시고 본격적인 소설 쓰기에 몰입하셨다는 근황과 함께
히말라야를 무려 10여 차례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독자의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주최 측에서 미리 보내 준 책에 선생님 사인을 받고. 룰루랄라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무엇보다도 소득이 컸던 건 문화일보에 연재하던
그 당시의 외등 육필 원고를 하나씩 선물 받은 거예요.
(외등을 쓰던 1992년 갑자기 절필 선언을 하셨죠)
혼이 담긴 원고지에 사인펜으로 직접 쓰신 7장 분량의 원고인데
지금이야 빠른 이메일이 있으니 문제없지만
그 당시엔 팩스를 이용해서 1회분 원고를 보내셨다고 해요.
보내고 난 후의 원본을 보관해오다 독자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져오셨다는데 예정보다 많은 여성독자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원고는 30명분이고 참석인원은 40명이 넘고...
결국 행사 마지막 때 선생님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서로 받겠다고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엄두가 안나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이런 데선 그렇게 있으면 못 챙긴다나요?
사실 욕심은 났지만 그러다 사고라도 날까 걱정스러웠어요.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독자들을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구요.
아무튼 9월의 마지막 날 휴일.
제 생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물 받았어요.
하루가 지난 지금도 내내 어둠 사이로
어제 받은 따뜻한 감촉이 제 가슴 안에서 물고기처럼 펄떡이거든요.
이 마음 그대로 이 가을을 보내야겠어요.
윤희님에게도 행복한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파
몇 자 적었어요.
(좀 길었죠? 제가 밤이 되면 수다스러워지거든요. 웃음~)
이선희 / 책장을 넘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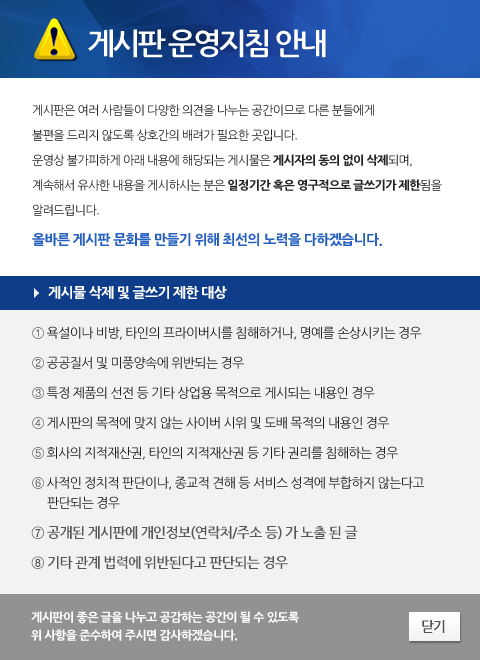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