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이 다가오면 아버지께서는 탈탈거리는 소달구지를 끌고 산으로 가셔서 붉은 황토를 퍼다가 저 멀리 골목길에서부터 우리 대문앞까지 뿌려놓고 대문에는 솔가지를 엮어 달아 놓으셨다.
마을공터에는 청솔가지와 푸른 대나무로 달집을 높이 만들고 늘 어른들 쉼터가 되었던 우리집 아랫채에는 온 동네 어른들이 모여 풍물놀이[농악]를 연습하고 하얀 문종이로 꼬깔모자를 만들고 물들인 한지로 함박꽃을 만들어 꼬깔에 달고 가마솥에는 동태탕이 끓고 커다란 독에는 밑에 왕겨불로 뭉근히 막걸리를 삭히고 있었다.
엄마께서는 온갖 채소로 나물채를 만들고 오곡 찰밥을 짓고 각종 부름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깨물게 하셨다.
그래야 한해동안 병에 안 걸리고 악한것들이 헤치지 못한다고 그때는 왜 그리 강정이나 여러가지 음식도 많이 만들었던지 설에 만든 강정이나 강엿이 보름에도 부럼 깨무는데 사용되고 아침을 먹고 소에게까지 온갖 채소와 밥을 차려 주고 나서는[그떄는 참 이상했는데 한해동안 고생할 소에게 힘내라는 의미라고 함] 이제 어른들이 다 모여들어 풍물을 갖추고는 농지 천하지 대자본이란 큰 깃발을 앞세우고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는데 온동네가 들썩이도록 흥겨웠고 집집마다 쌀 한말씩 또 여유가 있는집은 쌀위에 지폐까지 두둑히 얹어주기도하고 그러면 풍물단도 신이 나서 집 뒤주부터 부엌까지 하다못해 화장실[변소]까지 지신을 밟으며 신명나게 사물놀이로 그 집을 축복했던 온마을이 들썩이도록 축복했던 정말 보름달같은 마음들이 가득했던 풍속이였다.
에헤라 지신이여~~옹헤야,하고 상쇠가 먹이면 이집에 조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하여튼 참 흥겨운 가락이 이어지고 했었다.
그렇게 받아들인 쌀이며 돈들은 그 동네 공동 기금이되어 필요한데 쓰고 아주 가난한이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품앗이 공동체를 이루었던것이다.
그 풍물이 얼마나 신났던지 쪼무래기 아이들은 쫄랑쫄랑 따라 다니며 엉덩이를 흔들고 어깨를 들석이고 아낙네들은 담넘어로 그 풍물단을 훔쳐보며 자기집 차례를 기다리던 정겨운풍경들...열집밥은 먹어야 한해 건강하다고 집집마다 조그만 대소쿠리와 복조리 들고 밥 얻으러 다니던 어린시절 그 갖가지 밥들을 얻어와서 친구들과 한집에 모여 큰양푼에 넣어 비벼먹으면 어찌나 맛나던지요.
저녁에 달이 둥실 떠오르면 어른들은 달집에 불을 붙이고 하늘높이 불꽃이 튀기며 타닥 타닥 타 들어가던 달집 태우기.. 그 달집 불이 꺼져 갈때 쯤 이상하게 산 하나 사이두고 맞 닿은 동네 청년들끼리 달산 [산꼭대기]차지한다고 서로 돌도 던지고 싸움을 하던 추억도 생각난다.
낮에 마트에 들렸더니 보름이라고 부럼용으로 북한산 호두와 중국산 피땅콩이 보여서 조금 사오고 많이는 못해도 보름 흉내라도 내 볼까하고 무우나물이며 고사리며 토란대도 삶아 물에 불리고 이것저것 손질을 해보다가옛 고향 추억속으로 여행을 떠났더니 색동 치마저고리 갈래 머리 쫑쫑 땋아주던 엄마도 그립고 어릴적 막내여동생 사랑방에 불러내려 창가 한자락부르라고 부탁하던 아버지도 그립고 순박하고 투박하게 정겨웠던 이웃어르신들도 그립고 가슴을 둥둥 울리던 그 풍물소리도 그립다.
다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 아직도 내 맘속에서는 어제인양 살아나서 보름날밤에는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졸려도 눈비비며 참았던 그 어린날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하얀밤을 세워볼까 싶다.
세월따라 다 떠나가 버린 수많은사람들..희미해져 가는 풍속처럼 내 곁에 있었던 소꿉놀이하던 추억속에 친구들이 그리워온다.
신청곡:강부자 - 달타령, 불놀이야 - [누구노래인지 가물가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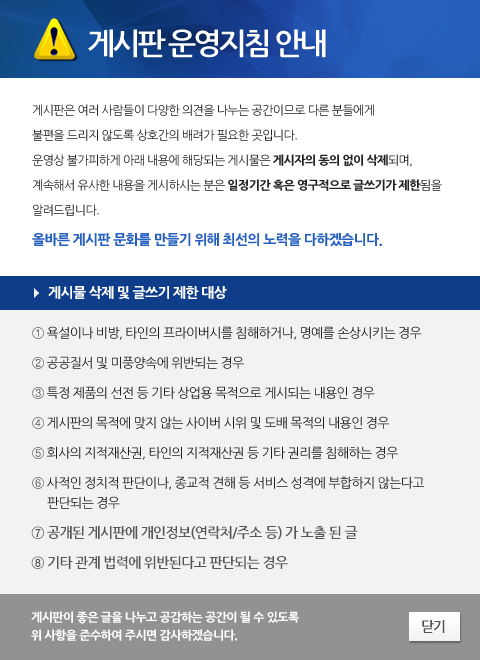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