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쏟아지는 오후면, 현관에 놓인 낡은 분홍색 슬리퍼 한 켤레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30년 전, 네가 우리 집 앞에 헐떡이며 뛰어와 내밀었던 그 슬리퍼야. 시장에서 3천 원 주고 샀다며,
"네 발 뒤꿈치 갈라진 게 속상해서 사 왔다"고 수줍게 웃던 네 얼굴이 빗줄기 사이로 번져옵니다.
우린 참 지독하게도 가난했지. 보증금 까먹으며 버티던 그 부창동 옥탑방에서, 너랑 나랑은 유통기한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네가 가져온 그 슬리퍼를 신고 우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검은 봉지에 담긴 새우깡 한 봉지를 사 들고 오곤 했어.
빗물에 젖은 슬리퍼가 '찌걱찌걱'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린 서로 그 소리가 웃기다며 배를 잡고 웃었지.
그러던 어느 날, 넌 아무 말도 없이 짐을 뺐더구나. 밀린 월세 때문이었는지, 아픈 어머니 때문이었는지...
텅 빈 네 방엔 내가 준 작은 손거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였어.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냉정한 기계음만 돌아올 때, 나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었어.
내 슬리퍼 짝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의 짝이었던 너는 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거니.
보고 싶다, 친구야. 정숙아~ 그리움이 오늘따라 쏟아져 내려.
네가 사준 그 낡은 슬리퍼는 이제 다 닳아서 밑창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신발장 구석에 모셔뒀어.
혹시라도 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그 '찌걱' 소리를 내며 같이 시장통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어서.
네가 없는 서울 하늘 아래서
나는 여전히 그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너를 기다려.
지금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든, 제발 밥은 굶지 마.
내 얘기가 너 사는 동네까지 닿는다면, 내 이름 석 자 기억하고 꼭 한 번만 연락해 줘.
그때 못한 밥 한 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살게.
사랑한다, 내 소중한 친구야.
살아서,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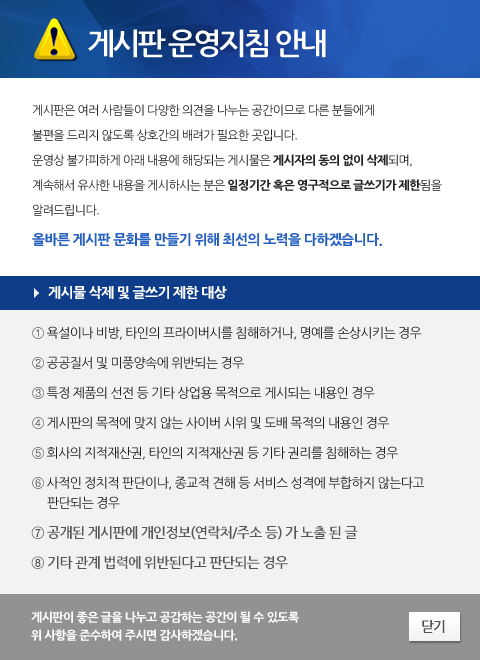
댓글
()